우리땅 영지 순례 - 희양산 봉암사

■ 희양산


가은에서 서북쪽으로 길을 잡아 가다보면 멀리 흰 봉우리가 불쑥 솟아 한눈에 들어온다.
바로 희양산이다.
그처럼 흰 바위봉우리를 이고 있는 희양산은 옛부터 ‘절이 들어서지 않으면 도적이 들끓을 자리’로 지목되어 왔다.
해발 999m의 희양산은 부드러우면서도 곳곳에 암벽이 솟아있는 바위산이다.
경북 문경시 가은읍과 충북 괴산군 연풍면을 가로 지른다.
이쪽에서 보면 바위투성이, 저쪽에서 보면 나무가 많은 산이다.
그래서 가은 사람들은 “바위산”이라 부르고, 반대편에 사는 괴산 사람들은 “흙산”이라 부른다.
희양산은 자연경관도 국내 으뜸에 꼽힌다.
솟은 바위의 모습은 북한산 국립공원의 인수봉, 선인봉이나 설악산 국립공원의 울산바위 등에 견줄 만하다.
거대한 바위 봉우리를 정점으로 백두대간을 따라 남쪽으로는 대야산, 북쪽으로는 백화산이 이어진다.

희양산 산정에는 40m 정도의 벼랑을 이룬 암봉에 다섯 줄이 파여져 있는데 이것은 명나라의 이여송(李如松)이 조선의 흥기를 막기 위하여 칼로 혈도(穴道)를 끊은 것이라는 전설이 얽혀 있다.
또한 봉암사의 용바위에서는 가뭄이 계속될 때 기우제(祈雨祭)가 행하여졌는데, 특이한 것은 삶은 돼지머리로 지내지를 않고 산 돼지를 몰고 올라가서 바위 위에서 찔러 피를 흘리게 하여 기우제를 지냈다고 한다.
용이 피 묻는 것이 싫어서 비를 내린다는 속신에서 유래한다.
이 밖에도 희양산에는 대궐터라고 불리우는 석성(石城)과 군창지(軍倉址)가 있고, 산록에는 홍문정(紅門亭)·배행정(拜行亭)·태평교(太平橋) 등 임금과 관련된 명칭을 가지는 곳이 많아 신라 후기의 난세 때에 경순왕의 행궁(行宮)이 있었던 곳임을 증명해 주고 있다.

또한 봉암사 주변 계곡에는 기생이 세상을 비관하여 몸을 던졌다는 용연(龍淵)을 비롯하여 최치원(崔致遠)이 낚시를 즐겼다는 취적대(取適臺), 야유암(夜遊巖), 백송담(柏松潭), 백운대(白雲臺) 등의 소(沼)들이 있다.

■ 봉암사
봉암사는 풍수 문외한이 봐도 감탄이 절로 나온다.
그 희양산 중턱에 봉암사가 들어앉아 있다.
뒤로 우뚝 솟은 희양산과 사찰 앞을 흐르는 계곡 사이에 놓인 전각들은 이곳이 천혜의 수행처임을 단박에 일깨운다.


광복 후 큰 뜻을 품은 스님들이 한국 현대불교를 새롭게 설계할 때 왜 이곳을 찾아 '봉암사 결사'를 했는지 이해가 간다.
1947년 성철ㆍ청담ㆍ자운ㆍ월산ㆍ향곡ㆍ혜암ㆍ성수ㆍ법전 스님 등이 “부처님 법대로만 살자!”며 봉암사에서 결사를 했다.
이 봉암사 결사를 계기로 독신 출가승이 중심이 된 조계종단이 우뚝 서게 됐다.
그러니 봉암사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역사에서 꺼져가던 불씨를 되살린 ‘심장’역할을 한 수행처다.
봉암사는 지금도 조계종의 유일한 종립(宗立) 특별수도원으로 1년에 단 하루 부처님오신날에만 일반에 개방하는 것 외에는 1년 내내 참선 수행이 이어지는 한국 불교의 자존심, 자부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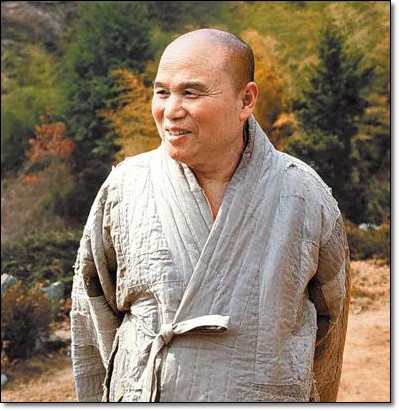
봉암사는 희양산의 가장 넓고 깊은 터에 자리잡고 있다.
자연의 이치를 절묘하게 수렴하는 터로, 양택풍수의 원리를 충실하게 반영한 것이다.
봉암사 일대의 숲은 충북과 경북의 접경인 백두대간 중부 생태계의 원형을 이루고 있다.
경내를 휘감아 도는 소나무 군락을 비롯해 참나뭇과의 갈참나무와 졸참나무가 그윽한 깊이의 숲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느티나무가 고요한 정적을 더한다.
또한 수달, 하늘다람쥐, 담비, 삵을 비롯한 주요 멸종위기종이 광범위하게 서식한다.
이렇게 높은 산 중턱에 제법 너른 터를 닦아 자리한 봉암사는 신라 하대 구산선문의 하나인 희양산문이 열린 절이다.
신라 헌강왕 5년(879)에 도헌 지증대사(道憲 智證大師, 824~882)가 창건했다.
봉암사에 있는 지증국사 비문에 따르면 도헌은 경주사람 김찬양의 아들로 어려서부터 불도에 뜻을 두고 부석사에서 출가하였다.
열일곱에 구족계를 받고 정진에 힘썼고, 스물에 이미 따르는 사람이 많았다.
그는 임금의 간곡한 권유에도 수도인 경주로 나아가지 않고 수행정진에 힘썼다.
그러던 중에 심충이란 사람이 희양산에 있는 땅을 내면서 선원을 세우기를 청하니 와 보고 “이 땅을 얻었다는 것이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느냐? 승려들이 살지 않는다면 도적굴이 될 것이다” 하면서 봉암사를 세웠다.
이렇게 하여 신라 하대의 새로운 사상인 선종의 구산선문 가운데 희양산문이 개창되었던 것이다.
봉암사 중심의 삼층석탑은 흰빛으로 말갛다.
희양산의 거대한 바위와 색이 같다.
1100년이 넘었으되 탑 윗부분인 보주며 보륜까지 거의 완전하다.
불국사의 석가탑을 모델로 삼았다는데, 석가탑이 장중한 맛을 준다면 이 탑은 단정하면서도 날렵한 상승미를 보여준다.

문경을 통틀어 국보는 단 한 점. 그게 봉암사에 있다.
지증대사 부도비다.

멀리 남해에서 가져온 점판암에다 지증대사의 업적을 새긴 것이라는데, 사실 이것보다는 그 옆에 있는 보물인 지증대사 부도가 눈길을 더 붙잡는다.
통일신라 석공예술의 극치라는 말은 여기다 붙여줘야 마땅하리라.
부도는 기품이 넘치고 힘차며 아름답다. 단단한 화강암을 비누 조각처럼 세밀하게 깎아낸 솜씨라니…. 한 쪽의 지붕이 깨지는 바람에 국보의 반열에는 오르지 못했지만, 크기와 솜씨로 보면 명품도 이런 명품이 없다.

대웅보전 앞마당에 양쪽으로 늘어선 상당한 크기의 노주석도 그 속에 깃든 시간의 무게가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대웅보전의 앞마당에는 석등이나 탑이 자리하는 것이 보통이나 봉암사에는 특이하게 돌기둥 위에 넓은 판석을 올린 노주석이 2기 있다.
노주석은 한밤중 행사 때 관솔불을 피워올려 주변을 밝히는 조명시설이다.

사찰에서 서쪽으로 300m 떨어진 계곡에 위치한 옥석대(玉石臺)는 암석에 조각된 불상 아래 넓게 깔린 암반에서 목탁소리가 난다는 명승지이다.
이 옥석대에는 바위의 북벽을 다듬고 7∼10㎝ 정도의 깊이로 감형(龕形)처럼 판 곳이 있는데, 그 안에 높이 약 6m의 좌상(坐像)이 양각되어 있다.
마애여래좌상도 유독 희고 맑다.
일부러 그런 바위를 택했는지 바위를 파서 새겨넣은 여래상의 얼굴이 유독 환하다.

◆ 사진첩







































































































'雲水 天下 > 나는 자연인이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우리땅 영지 순례 - 사불산 윤필암 묘적암 (0) | 2021.05.24 |
|---|---|
| 우리땅 영지 순례 - 만어산 만어사 (0) | 2021.05.23 |
| 우리땅 영지 순례 - 오봉산 주사암 (0) | 2021.03.21 |
| 우리땅 영지 순례 - 금곡산 금곡사 (0) | 2021.03.21 |
| 우리땅 영지 순례 - 운제산 오어사 / 자장암 / 원효암 (0) | 2021.03.06 |